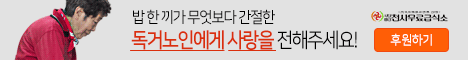최영해 논설위원
최영해 논설위원누군가는 ‘배신’해야 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유승민은 캠프에 있던 안종범에게 “청와대에 가게 되면 ‘문고리 권력’ 3인방에게 휘둘리지 말고 대통령과 직거래하라”고 당부했다. 유승민의 충고에도 안종범은 경제수석을 하면서 3인방의 장막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기만 하다가 큰 화(禍)를 입었다.
유승민이 ‘자기 정치’에 나선 것은 2015년 4월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이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며 보수혁신을 외치면서다. 보수정권 10년, 기득권 보수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본 것이다. 여기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야당에서나 할 법한 소리까지 하자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라는 한마디로 그를 원내대표에서 쫓아내 버렸다. ‘공천 학살’도 당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했어야 할 ‘배신’을 유승민이 감행한 것이라고 나는 본다. ‘대통령의 뜻이 바로 정의(正義)’라는 친박(친박근혜)의 말은 왕정시대에나 있을 법한 소리다. 박 대통령이 유승민을 매몰차게 내치지 않고, 청와대 오찬 행사에서 자리를 맨 구석으로 처박는 모욕을 주지 않고 그를 품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2년 전 유승민이 주창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진보 성향 경제정책을 박 대통령이 고민했더라면 최순실의 국정 농단 파장이 지금처럼 커지진 않았을지 모른다. 주도권을 빼앗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지금 차별화할 수 있는 대선 공약을 찾느라 진땀을 흘릴 수도 있다. 유승민이 원내대표를 그만둔 지 110일 후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만들어져 19개 대기업에서 486억 원을 모금한다. 또 이로부터 두 달 보름 뒤엔 K스포츠재단이 설립돼 288억 원을 거둬들인다. 그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한국갤럽이 지난 주말 발표한 유승민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1%, 대구에서도 2%밖에 안 된다. 주군(主君)을 배신한 유승민을 “시체에 칼을 꽂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은커녕 다음 총선에서 국물도 없다는 말도 공공연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나도 죗값을 치르겠다”며 대선 불출마와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야 유승민이 사는 길이었다는 뒷말도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옆에서 심부름만 했다’는 최순실을 멀리하고, 쓴소리하는 까칠한 유승민 같은 주변 사람들을 내치지만 않았어도 광화문광장의 촛불과 태극기가 지금처럼 반쪽으로 갈라져 있을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만 가까이한 대통령의 불행은 유승민이 치르고 있는 혹독한 배신의 대가와 비교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