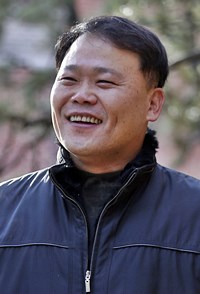
50~60년대 한·일회담 자료 실은
'日韓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번역 출간한 이동준 교수
"한국이 배상을 요구한다면 일본은 한국에서 민둥산을 녹색으로 만든 것, 철도를 깐 것, 항만을 건설한 것, 수전(水田)을 조성한 것, 대장성의 돈을 매년 1000만~2000만엔이나 갖고 나와 한국 경제를 배양(培養)한 것을 반대 이유로 제출하고, 한국 측 요구와 상쇄할 것이다."
1953년 10월 한·일 회담 당시 일본의 수석 대표였던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노골적으로 쏟아냈다. 사실상 '일본의 식민 통치를 은혜로 생각하라'는 식의 망발이었다. 이른바 '구보타 망언'이후 4년간 한·일 회담이 중단됐을 만큼 파장이 컸다. 하지만 구보타의 진짜 망언은 그다음에 있었다. 회담 결렬 직후 구보타는 극비 문서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종래의 반일(反日)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공개적으로 발표해 자신의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일본) 측으로서는 이승만 타도를 위한 노력을 개시해야 한다'고 썼다.
이 문서는 50여년간 비밀로 분류됐다가 일본 외무성이 2006년부터 한·일 회담 관련 외교 문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2010년부터 일본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 자료집' 발간 작업에 편집자로 참여했던 이동준 일본 기타큐슈대(北九州大)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대대로 일본 정부의 본심이 과거사 반성보다는 '구보타의 망언'에 가까웠다는 점에 한·일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측 자료집은 지금까지 50권이 발간됐으며, 총 100권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 이 자료집에 실린 일본 외교 문서와 일본 외교 대표의 인터뷰·수기(手記)를 추려 '일·한(日·韓) 국교 정상화 교섭의 기록'(삼인출판사)으로 펴냈다.

박정희·김종필과 밤샘 술자리서
이세키 日 외무성 국장
나는 정신을 잃고 뻗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직후 곧바로 '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서 발간에 착수했다. 이세키 국장 등 한·일 회담을 담당했던 외무성 관료 19명이 편집위원으로 참가해서 공식 기록은 물론 일본 측 대표 30여명의 수기·인터뷰 자료를 모두 백서에 담았다. 이 책에 등장하는 한·일 정치인과 외교관만 600여명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1965년 6월 한·일 협정 체결 직전에 국교 정상화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서를 발간했지만, 체결 이후에는 한국 대표단의 인터뷰와 수기를 공식 자료로 남긴 적이 없다. 이 교수는 "당시 한·일 회담은 양국의 외교 역량을 모두 동원한 '총력전'이었다"면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상대를 비판하기에 앞서 과거의 기록부터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