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형의 느낌의 세계] 땅속을 전진하는 두더지의 힘찬 앞발처럼
연말이면 대형 서점에서 서성이게 된다. 내년에 쓸 다이어리를 사기 위해서다. 다이어리를 사놓고 제대로 쓴 적이 없는데도 그런다. 연말마다 사놓고 한두 달 쓰다가 다이어리는 잊힌다. 그런데도 매해 연말이면 이러고 있는 것이다.
10년 넘게 같은 브랜드의 다이어리를 사왔다. 어떤 장식도, 무늬도 없는 튼튼한 재질에 모서리를 둥글린 각도의 적절함, 고무줄이 달려서 고정할 수 있는 것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름 때문이다. 그 브랜드의 이름을 우리말로 옮기면 ‘두더지 가죽’이 된다. 두더지 가죽으로 만들지 않았을뿐더러 어떤 가죽으로도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두더지 가죽이 브랜드명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두더지에 끌렸다. 두더지를 본 적도 없고 생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두더지’의 이미지가 나를 붙잡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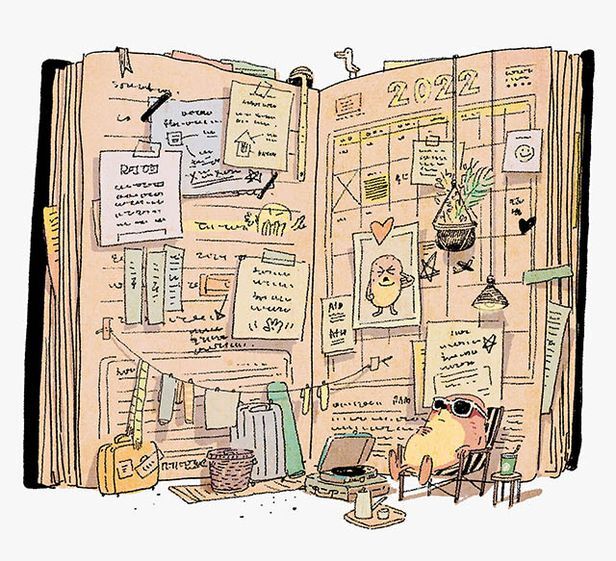
두더지는 땅속에 산다. 거기 살면서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헤쳐 나가는데, 땅을 파는 게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땅을 판다. 낮이나 밤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그가 살아 있는 한. 그래야 애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더지는 거의 앞을 보지 못한다. 어두컴컴한 땅속에 살아서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앞을 못 봐서 땅속에 살게 된 건지 모르지만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두더지가 매일 땅을 파며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쓸쓸하고, 또 짜릿했다.
이 용감하며 무식하고 또 성실한 두더지를 떠올리게 하기에 두더지 가죽은 아니지만 이름은 두더지 가죽인 그 다이어리를 샀다. 내게 두더지의 활력과 근면이 깃들길 바라면서 말이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브랜드명의 다른 의미를 알게 되었다. 몰스킨(moleskine)은 두더지 가죽만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수첩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기름을 먹인 천을 커버로 쓰고, 고정할 수 있는 고무줄을 단 수첩을 프랑스에서 ‘카르네 몰레스킨(carnet moleskine)’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프랑스어 몰레스킨(moleskine)은 영어인 몰스킨(moleskin)으로부터 왔고. 이 수첩의 존재를 책에서 읽은 한 이탈리아의 디자이너가 1997년에 다시 만들었다.
실은 제작이 아니라 부활이었다. 요즘은 거의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파는 곳을 찾기 힘들다고, 작가가 1987년에 쓴 것으로부터 더듬어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수첩 브랜드 이름이 몰스킨이 된다. 몰스킨에 대해 책에 쓴 사람은 1940년에 태어난 브루스 채트윈이라는 영국 남자다. 소더비사의 경비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곧 인상파 회화 전문 감정사가 되고, 8년 후에는 소더비의 최연소 이사가 된다. 미술품 감정을 오래하는 바람에 시력에 문제가 생겨 소더비를 그만두고, ‘선데이 타임스’에 입사해 예술과 건축 담당 기자로 일하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인생이 바뀐다. 93세인 여성 예술가가 파타고니아 지도를 그린 것을 보여주며 늙어서 갈 수 없는 자기 대신 가달라고 요청하자 응했던 것이다.
그 후의 이야기는 이렇다. 그는 바로 페루 리마로 날아가서 파타고니아로 들어간다. 검은색 카르네 몰레스킨과 함께. 그리고, 3년 후 파타고니아 여행기인 ‘파타고니아’라는 책을 낸다. 여행 문학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이 책을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의 작가 루이스 세풀바다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읽으며 감탄 부호와 강조 표시로 꽉 채우고 말았다.” 브루스 채트윈은 루이스 세풀바다에게도 카르네 몰레스킨을 줬다고 한다. 브루스 채트윈은 두 번째 여행기 ‘송라인(The Songlines)’에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된 카르네 몰레스킨에 대해 쓰고, 이 수첩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몰스킨으로 부활한다. 한국판 표지는 바로 이 검은색 몰스킨이 주인공이다.
다시 두더지로 돌아와서. 두더지가 매일같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권투 선수의 주먹만큼이나 강한 앞발 때문이라고 들었다. 엄지도 두 개씩이라고. 이 엄청난 힘으로 매일 땅을 파며 돌진하는 것이다. 땅을 파도 계속 땅이고, 돌진에는 끝이 없으니 계속 돌진해야 하지만, 두더지는 그저 나아간다. 이게 두더지의 삶이다. 어쩔 수 없이 ‘두더지’는 내게 메타포일 수밖에 없다. ‘땅속’도 ‘땅파기’도 ‘돌진’도 ‘나아가기’도 모두 인간의 일생에 대한 거대한 은유로 읽힌다. 그러니 ‘두더지 가죽’을 샀던 것이다.
나는 두더지 앞발의 힘을 존경한다. 물론 ‘두더지 앞발’ 같은 저돌적인 추진력을 내 안에 심고 싶어서다.
'사설-신문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與는 무모한 ‘검수완박’, 檢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물러서라 (0) | 2022.04.12 |
|---|---|
| ‘58년 記者’ 김대중 “권위주의 시대, 신문기자가 맞서 싸울 대상 있어 행운이었다” [송의달 LIVE] (0) | 2022.04.08 |
| 지식인이 수치심을 처리하는 방식 (0) | 2021.06.01 |
|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최대 걸림돌은 선거 비용? (0) | 2021.03.07 |
| 대한민국을 '안 되는 나라'에서 다시 '되는 나라'로 (0) | 2017.0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