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도덕 내세우는 ‘정치적 관종’을 경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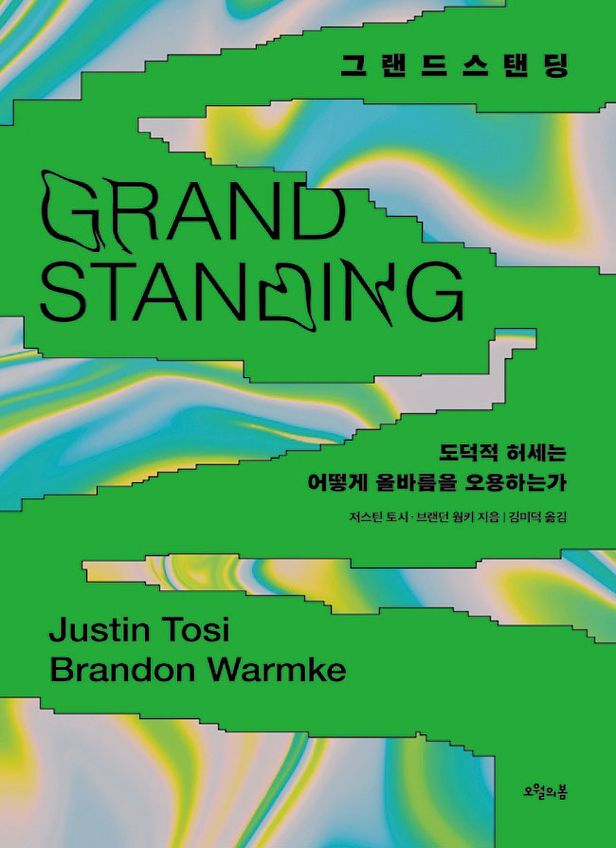
그랜드스탠딩|저스틴 토시·브랜던 웜키 지음|김미덕 옮김|오월의봄|332쪽|1만8500원
‘이게 그렇게 난리 칠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에 비옷을 입었다. 군인은 비를 맞고 있는데 대통령은 비옷을 입었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4년 일회용 커피잔을 든 손으로 거수경례에 답했다가 미국 극우 매체로부터 질타당했다. 해병대 경례를 받는 자세가 글러먹었다는 이유였다. 정치권을 벗어나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진정 분노해야 할 일이었을까.
해프닝을 문제로 만들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 미국 텍사스공대와 볼링그린 주립대 철학 교수인 두 저자는 ‘그랜드스탠딩(grandstanding·과시)을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본다고 한다. 특정인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지적질을 보며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들에게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타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이들을 흔히 ‘관심 종자’(관종)이라고 부른다.

정치인, 연예인, 일반인 모두 이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 여배우 메릴 스트리프, 극우 매체 운영자 등을 해당 사례로 지목한다. 미국 정치·사회 사례를 배경으로 하지만 본질은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온갖 이슈에 숟가락을 얹으며 ‘저 도덕적으로 우월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한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발언은 점점 더 극단화한다.
과시라는 말처럼 이들은 본질적인 윤리적 가치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두 철학자의 진단이다. “이들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세상에서 뭔가 해냈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명성과 지배력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자신을 높인다.” 한국에서도 익숙한 풍경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상대편 정치인을 저격하면 ‘좋아요’와 ‘구독자 수’라는 보상이 따라온다. 불특정 다수에게 ‘난 좋은 사람’이라고 광고하기 쉬워진 인터넷은 이를 악화시켰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랜드스탠딩은 같은 편 의견에 ‘말 보태기’, 더 극단적이고 선명한 발언하기, 팩트 날조를 통해 강화된다.
현실 정치도 문제다. 정책보다 후보의 인성을 따지는 유권자가 많아지자 선거 캠페인은 자신이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경연하는 장이 됐다. 그랜드스탠딩, 우리말로 하면 ‘도덕 관종 짓’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다. 서로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래서 익숙한 풍경이다. “좌우에 관계 없이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다.
지금 여러 국가에서 드러나는 분열의 뿌리에는 ‘그랜드스탠딩’이 있다는 지적도 한다. 각 진영이 서로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쏟아내며 어깨싸움을 하는 사이, 중도파는 공론장에서 사라진다. 또 사회를 바꿀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노’는 가짜 사이다 발언으로 불완전 연소하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발휘되지 못하게 됐다고 우려한다.
저자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을 통해 이런 현상을 비판한다. “니체의 시각에서 탁월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는 목표, 즉 인간이 이뤄야 하는 선한 목표에 쏟는다. 탁월한 사람은 도덕성을 자신의 지배욕을 만족시킬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다. 탁월한 사람은 그랜드스탠딩을 하지 않는다.”
도덕 관종 짓은 효과가 탁월하다. 니체식으로 탁월한 사람이 안 되어도 좋으니 영향력을 확대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관종’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규범을 바꿔야 한다’는 처방은 다소 심심하다. 도덕 관종 짓을 ‘노상 배변’이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노상 배변을 당연시하면 문화가 바뀌지 않지만,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면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종 짓을 사회가 용인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관종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한다. 드러내놓고 ‘저격’하면 더 존재감이 커지니 무시하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자신도 관종 짓을 할지 모른다는 반성도 잊지 말라고 덧붙인다. 멀리 미국 이야기가 아니다.
'종교-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훈수 둘 때 훨씬 잘 보이는 까닭, 남의 바둑판엔 이게 없다 [백성호의 한줄명상] (0) | 2022.06.16 |
|---|---|
| 안식일 원조는 유대교 토요일… 기독교는 로마가 일요일로 바꿔 (0) | 2022.06.14 |
| 월세 400 청담동 기숙사 제공… 여에스더가 자랑한 ‘직원 복지’ (0) | 2022.06.06 |
| “심판의 날 구원받으려면 선하게 살라” 야훼도 알라도 똑같은 가르침 (0) | 2022.05.17 |
| ♡원(○)없이 살아 봅시다 (0) | 2022.04.16 |




